우리가 안마사를 독차지한다고요? (2024-08-19)
허상욱 | 시각장애인 안마사

개인상담뿐 아니라 집단상담, 교육, 워크숍 등을 진행하기도 합니다. 필자 제공
선생님, 편지는 처음이네요. 창밖으로 굵은 비가 묵직하게 내리꽂히는 깊은 여름밤이에요. 상담은 다 끝났는데 쉽사리 자리에서 일어나지지 않아 펜을 들어봅니다. 이런 날이 가끔 있어요. 내담자의 이야기가 잘 소화되지 않는 날이요. 이런 날은 괜스레 딴청으로 마음의 무게를 덜어내는 시간이 필요하더라고요.
빗소리를 듣고 있으니 문득 외롭다는 생각이 들어요. 상담실에서 내담자를 맞이하는 일은 설레는 일이에요. 내담자에게 이 시간이 환대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정성을 다하는 일이고요. 하지만 방음 처리가 된 사각형의 밀폐된 상담실에서 내담자와 단둘이 마주 앉아, 그분이 풀어놓는 고단한 삶의 이야기를 마주하는 순간은 온전히 제가 홀로 감당해야 하잖아요. 게다가 우리는 직업윤리상 비밀보장의 의무가 있으니 어딘가에 마구 털어놓을 수도 없고요.
물론 제가 혼자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제게는 저를 가르쳐주신 많은 선생님과 제 상담자이신 당신과 함께 수련하고 있는 동료들이 있지요. 무엇보다 제게 마음을 내어주고 있는 내담자가 제 앞에 있고요. 하지만 가끔 제가 무대 위에서 듀엣 춤을 추고 있는 댄서처럼 느껴지곤 해요. 나를 응원하는 사람들은 무대 뒤에 있어요. 제겐 해내야 하는 저만의 몫이 있잖아요. 누구도 대신해줄 수 없는, 그 순간 제가 해내야만 하는 그런 역할이요. 제가 삐끗하는 순간 제 파트너인 내담자가 다칠 수도 있으니, 50분이라는 시간 동안 피하지 않고 집중해서 감당해내야 하는 일이요.

나는 20년 경력의 시각장애인 안마사다. 아홉살에 홍역을, 열아홉살에 폐렴과 결핵을 앓았다. 심한 고열이 있었고, 연속해서 시력 저하가 왔다. 스물아홉살에 초자체 혼탁 제거 수술을 했고, 2회의 망막박리 수술과 염증 제거 수술을 받았다. 수차례의 레이저 시술을 거듭했으나 1999년 말, 최종적으로 실명 판정을 받았다.
눈이 보이지 않는 게 어떤 미래를 의미하는지 처음에는 온전히 자각하지 못했다. 약시 시절에는 불편하긴 했지만, 그럭저럭 비장애인들과 발맞추어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이다. 20대 초반부터 다녔던 잼과 젤리를 만드는 식품회사에서는 저시력자임에도 불구하고 공장장이라는 직위까지 올랐으니 나름 불편함을 견딜 수 있었다. 그러나 시력이 전혀 없는 ‘전맹’이 되고 나서는 직업을 선택하는 것이 사치처럼 느껴졌다.
눈이 보이지 않더라도 할 수 있는 일을 찾아보았다. 성남에서 대학가 근처의 당구장을 하나 인수하여 운영했다. 서비스가 좋다는 소문 속에 하루 기십만원의 매출이 있을 정도로 장사가 잘되었다. 그러나 실제 내 손에 들어오는 돈은 턱없이 적었고, 매번 금전 출납에 펑크가 났다. 종업원들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시력의 부재는 큰 장벽이었다.
광고
1년을 채우지 못하고 당구장을 매각했다. 검정고시를 치르고 점자를 배우고 보행을 배웠다. 컴퓨터 초·중급 과정을 연이어서 한입에 쓸어 넣듯 해치웠다. 그러는 도중 아들이 태어났고, 부랴부랴 2001년 대전맹학교에 입학하게 되었다. 안마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였다. 이 일 외에는 직업적 대안이 없다는 생각에 묵묵히 안마사 수료 과정을 감당하였다. 실습할 때마다 온몸은 땀에 흠뻑 젖기 일쑤였다. 고된 실습 뒤 점심시간에 밥을 먹을 때면 손이 후들후들 떨려서 국물조차 떠먹을 힘이 없었다. 그렇게 3년의 실습 과정을 마치고 나니, 손에는 힘겹게 취득한 눈물의 자격증이 한 장 들려 있었다.
겉으로 보기에 안마사는 허울이 좋다. 유니폼을 깔끔하게 차려입고 손님들의 아픈 곳을 해결해 주니 거반 의사라 여겨지기도 한다. 손님들도 선생님, 선생님 하고 불러주니 기분도 나쁘지 않다. 언젠가는 안마 덕분에 산삼을 먹고도 해결되지 않던 발바닥 냉통이 깔끔히 해결되었다는 말도 들었다. 누군가는 하루 7, 8알의 두통약을 먹어야 하루 업무를 마칠 수 있었는데 이제 그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는 말도 하였다. 호전되고 있다는 크고 작은 반응들은 안마 일을 지속하게 하는 큰 힘이 된다.
안마 일은 타인의 몸을 돌보는 일이지만, 내 몸은 등한시하는 육체노동이다. 동료 안마사가 “아이고! 오늘 삭신이 쑤시는 걸 보니 손님 많이 들겄네” 말하는 날은 여지없이 손님이 많이 든다. 날씨가 우중충하고 습도가 높은 날은 손님의 몸뿐 아니라 안마사의 근·골격계에도 여기저기 통증이 발생한다. 안마사의 급여는 시간을 얼마만큼 투여했느냐에 따라 달라지므로, 몸이 쓰러지게 힘든 날에도 웬만해선 안마 일을 쉴 수가 없다.
손님이 규칙적으로 드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손님이 없을 때는 하루 한 건도 못 하고 퇴근하는 날도 있다. 그러나 손님이 사정없이 밀어닥칠 때는 쉼 없이 하루 열여섯명의 손님을 받은 적도 있다. 언제 손님이 끊길지 모르는 형편에, 한 시간 일하고 몇 분 휴식시간을 갖는 노동 법규를 지키기는 쉽지 않다. 업주는 업주대로 안마사는 안마사대로 불법을 저지르며 묵인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조건 속에서 안마사들의 평균 재직 기간은 채 1년이 되지 않는다.
요즘 달갑지 않은 소식들이 언론 매체를 타고 들려올 때가 있다. 각종 마사지 협회에서 시각장애인 안마사 제도가 헌법에 명시되어 있는 직업 평등권에 위헌의 여지가 있다고 수시로 대법원에 소송을 걸어오는 것이다. 직업 평등권보다 약자를 보호해야 하는 법이 상위법에 들어 있는 것을 무시한 터무니없는 소송이라 생각한다.
몇 년 전엔가 대전 홍명상가 지하도 입구에서 구걸하는 시각장애인의 바구니를 행인이 걷어찬 사건을 전해 들은 적이 있었다. 나 같은 전맹들은 누군가의 도움 없이는 거리에서의 구걸조차 쉽지 않은 상황이다. 손님이 많으면 손가락이 아프고 손님이 없으면 배가 고플지라도, 안마사 일은 시각장애인이 일상에서 영위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직업이다. 불가피한 선택이자, 꼭 필요한 생존 수단이다.
'6411의 목소리'는 한겨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즈에도 게재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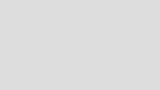




코멘트
1안마사라는 직업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시각장애인들의 권리에 대해 생각해보게 만들어서 좋은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