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기간은 절대 12개월을 넘지 않아요 (2023-11-06)
문세경 | 사회복지사·‘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저자

에너지 서울 동행단’ 사업에 참여한 문세경씨가 취약계층 집을 방문해 현관문에 방풍재를 붙이는 창호 시공을 하고 있다. 필자 제공
“이 일이 연장되면 또 하실 생각 있으세요?”
함께 일하는 동료가 내게 물었다. 지금 하는 일은 서울시 공공일자리인 ‘에너지 서울 동행단’ 사업이다. 여름철에는 에너지 절약을 위한 홍보와 캠페인을 하고 가을과 겨울철에는 취약계층의 노후 주택에 창호 시공을 해주는 일로, 6월1일 시작해 12월20일 끝난다. 내년에도 이어서 할 모양이다. 전문 기술이 필요한 시공 일이라 힘들다. 계속할지는 생각해 봐야겠다.
광고
연말이 다가오면 우울하다. 내년에도 일할 수 있을까? 한다면 무슨 일을 하게 될까? 나는 사회복지를 전공했지만, 경증의 청각장애가 있어서 일자리 구하기가 힘들다. 초등학교 5년 때 갑자기 청력이 나빠졌다. 보청기를 끼려 해도 나의 청력에 맞는 보청기를 찾지 못해 안 하고 있다.
학부를 졸업하고 사회에 나와 보니 차별받는 장애인이 너무 많았다. 차별은 구조적이고, 삶을 지속하기 어렵게 한다. 삶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법을 만들고, 건물 구조를 바꾸고, 장애인을 가두는 시설을 없애야 했다. 장애인운동판에 뛰어들었다. 활동가로 살다가 장애인 문제를 더 공부하고 싶어 석사과정을 밟았다. 공부 마치고 결혼하고 아이 키우느라 활동을 지속하지 못했다.
광고
광고
생계를 위해 사회복지 쪽 직업을 찾았을 때는 이미 늦었다. 잘 듣지 못하는 나를 써주는 곳은 ‘장애인 우대’라는 조건을 단 곳이다. 주로 공공기관에서 이런 단서를 단다. 공공기관은 장애인 의무고용을 지켜야 하니까. 서울시 일자리 포털에서 채용공고를 본다. 이력서를 백번도 넘게 넣었다. 서류 100% 합격, 면접 100% 불합격이다.
2009년 1월, 지인이 만든 쪽방촌 공동체인 ‘동자동사랑방’에서 사회복지사가 필요하다고 했다. 2년간 사무국장으로 일했다. 직책은 사무국장이지만 그냥 활동가였다. 최저임금도 안 되는 활동비를 받고 일했기에 생활비로는 턱없이 부족했다. 요양보호사로 일하며 부족한 생활비를 메꿨다. 그 일도 오래 하지 못했다. 서비스를 받는 어르신이 내가 말을 잘 못 듣는다며 교체를 원했다. 요양보호센터장은 어르신의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었다. 나는 잘렸다.
광고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생계를 위한 일을 찾았다. 서울시 뉴딜일자리 사업에 참여했다. 지역아동센터에 파견돼 아이들 독서를 지도했다. 근로계약서에 적힌 계약 종료일은 12월31일이다.
연말이면 계약이 종료되고 연초엔 새로운 일자리를 찾는 불안한 노동자로 산 지 십년이 돼 간다. 2015년에는 뉴딜일자리 아동독서멘토링 지도(10개월)를 시작으로 2016년부터 2018년까지는 단기 아르바이트로, 2019년에는 수도사업소 수질검사원으로(8개월), 2020년엔 여성인력개발센터 홍보마케터로(10개월), 2022년엔 50플러스센터 중장년 인턴으로(6개월), 국립공원공단사무소 직원 식당 조리원으로(3개월) 일했다. 2023년 현재 7개월짜리 공공일자리는 계약 종료까지 한달 반 남았다.
수도사업소와 국립공원공단을 빼고 나머지는 계약자(서울시)와 실제 일하는 곳이 다른 파견직이었다. 계약기간은 평균 8개월이다. 12개월은 절대 넘지 않았다. 12개월 이상 근무하면 퇴직금을 줘야 하니까.
“2023년 10월20일 오전 8시, 삼각지역에서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장애인 권리예산 보장 촉구 기자회견이 있습니다. 많이 참여해주세요.”
광고
며칠 전 아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에서 온 문자다. 30년 전 함께 활동했던 장애인 동지들은 아직도 이동권 보장을 요구하며 싸우고 있다. 출근길이 지체된다는 시민들의 온갖 비난을 받으며 말이다.
2007년 3월, 지난한 투쟁 끝에 장애인차별금지법이 제정되었다. 이 자리를 빌려 법을 만들기 위해 싸워 온 수많은 동지에게 경의를 표한다. 법이 제정된 지 16년이 되었지만, 여전히 우리 사회는 장애인에게 냉혹하다. 20년째 이동권 보장을 외치며 목숨 건 투쟁을 해도 완전한 이동의 자유는 오지 않았다. 그런 사회에 청각장애인의 일자리, 그것도 전공 관련 일자리 내놓으라는 나의 요구는 공허한 메아리 같다.
고령화 사회니 정년이 65살이라고 치자, 나에게 남은 노동 가능 기한은 십이년이다. 십이년 동안 근로 시작과 근로 종료를 몇번이나 반복해야 할까? 내년에도 내가 일할 곳은 있을까?
노회찬재단 후원하기 http://hcroh.org/support/
'6411의 목소리'는 한겨레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캠페인즈에도 게재됩니다.
※노회찬 재단과 한겨레신문사가 공동기획한 ‘6411의 목소리’에서는 일과 노동을 주제로 한 당신의 글을 기다립니다. 200자 원고지 12장 분량의 원고를 6411voice@gmail.com으로 보내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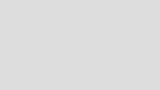





코멘트
3말씀해주신 활동들처럼 누군가 목소리를 냈기 때문에 지금의 사회까지 올 수 있었던 것 같은데요. 그럼에도 여전히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조차 싸워서 얻어내야 하는 현실이라는 게 답답하게 느껴집니다. 더 나은 사회가 더 빨리 올 순 없는 걸까 고민하게 되네요.
당장에 내 일자리가 없어질지 아닐지를 판단할 수 없다면 큰 불안감에 휩싸일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게 다른 요인도 아니고 본인의 신체적인 특성 때문이라면 말 그래도 시스템이 차별을 하는거라 생각합니다.
계약은 반드시 지켜져야합니다. 항상 응원하겠습니다.